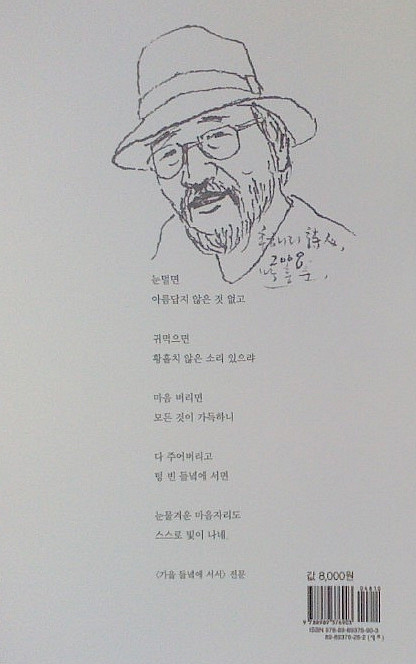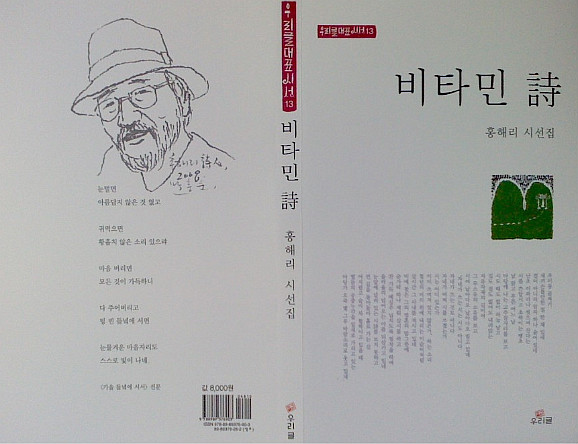새벽 세 시 / 홍해리
단단한 어둠이 밤을 내리 찍고 있다
허공에 걸려있는
칠흑의 도끼
밤은 비명을 치며 깨어지고
빛나는 적막이 눈을 말똥처럼 뜨고 있다
동백꽃 속에는 적막이 산다 / 홍해리
뚝!
비 그친 오후 / 홍해리
- 선연가嬋娟歌
집을 비운 사이
초록빛 탱글탱글 빛나던 청매실 절로 다 떨어지고
그 자리
매미가 오셨다, 떼로 몰려 오셨다
조용하던 매화나무
가도 가도 끝없는 한낮의 넘쳐나는 소리,
소낙비 소리로,
나무 아래 다물다물 쌓이고 있다
눈물 젖은 손수건을 말리며
한평생을 노래로 재고 있는 매미들,
단가로 다듬어 완창을 뽑아대는데, 그만,
투명한 손수건이 '하염없이 또 젖고 젖어,
세상 모르고
제 세월을 만난 듯
쨍쨍하게 풀고 우려내면서
매미도 한철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인가
비 그친 오후
일제히 뽑아내는 한줄기 매미소리가
문득
매화나무를 떠 안고 가는 서녘 하늘 아래
어디선가
심봉사 눈 뜨는 소리로 연꽃이 열리고 있다
얼씨구! 잘한다! 그렇지!
추임새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
둥근잎나팔꽃 / 홍해리
아침에 피는 꽃은 누가 보고 싶어 피는가
홍자색 꽃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가는 허리에 매달려 한나절을 기어오르다
어슴새벽부터 푸른 심장 뛰는 소리---,
헐떡이며 몇 백리를 가면
너의 첫 입술에 온몸이 녹을 듯, 허나,
하릴없다 하릴없다 유성으로 지는 꽃잎들
그림자만 밟아도 슬픔으로 무너질까
다가가기도 마음 겨워 눈물이 나서
너에게 가는 영혼마저 지워 버리노라면
억장 무너지는 일 어디 하나 둘이랴만
꽃 속 천리 해는 지고
타는 들길을 홀로 가는 사내
천년의 고독을 안고, 어둠 속으로
뒷모습이 언뜻 하얗게 지워지고 있다
난타 / 홍해리
양철집을 짓자 장마가 오셨다
물방울 악단을 데리고 오셨다
난타 공연이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빗방울은 온몸으로 두드리는 하늘의 악기
관람하는 나무들의 박수소리가 파랗다
새들은 시끄럽다고 슬그머니 사라지고
물방울만 신이 나서 온몸으로 울었다
천둥과 번개의 추임새가 부서진 물방울로
귀명창 되라 귀와 눈을 씻어주자
소리의 절벽들이 귀가 틔여서
잠은 물 건너가고 밤은 호수처럼 깊다
날이 새면 저놈들은 산허리를 감고
세상은 속절없는 꿈에서 깨어나리라
깨어지면서 소리를 이룬 물방울들이
다시 모여 물의 집에 고기를 기르려니,
방송에선 어디엔가 물난리가 났다고
긴급 속보를 전하고 있다
약수若水가 수마水鹿가 되기도 하는 생의 변두리
나는 지금 비를 맞고 있는 양철북이다.
소금쟁이 / 홍해리
북한산 골짜기
산을 씻고 내려온 맑은 물
잠시,
머물며 가는 물마당
소금쟁이 한 마리
물 위를 젖다
뛰어다니다,
물속에 잠긴 산 그림자
껴안고 있는 긴 다리
진경산수
한 폭,
적멸의 여백.

처서 지나면 / 홍해리
처서 지나면
물빛도 물빛이지만
다가서는 산빛이나 햇빛은 또 어떤가.
강가 고추밭은 독이 오를 대로 오르고
무논의 벼도 바람으로 꼿꼿이 섰다
이제는 고갤 숙이기 위하여
맨정신으로 울기 위하여
아래로 아래로 흘러가는 강물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반짝반짝 재재재재
몸을 재끼면서
그리움도 한 움큼 안고
쓸쓸함도 한 움큼 안고
사랑이란 늘 허기가 져! 하며
물결마다 어깨동무를 한다
다리 밑 소용돌이에 물새 몇 마리
물 속에 흔들리는 구름장 몇 점
가자! 가자! 부추기는 바람소리에
흘러가는 물결이여 세월이여.
처서 지나면
모든 生이 무겁고 가벼운
이 마음의 끝.

매화나무 책 베고 눕다 / 홍해리
겨우내 성찰한 걸 수화로 던지던 성자 매화나무
초록의 새장이 되어 온몸을 내어 주었다
새벽 참새 떼가 재재거리며 수다를 떨다 가고
아침 까치 몇 마리 방문해 구화가 요란하더니
나무속에 몸을 감춘 새 한 마리
끼역끼역, 찌익찌익, 찌릭찌릭! 신호를 보낸다
‘다 소용없다, 하릴없다!’ 는 뜻인가
내 귀는 오독으로 멀리 트여 황홀하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데
고요의 바다를 항해하는 한 잎의 배
죄 되지 않을까 문득 하늘을 본다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입술들, 혓바닥들
천의 방언으로 천지가 팽팽하다, 푸르다
나무의 심장은 은백색 영혼의 날개를 달아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언어의 자궁인 푸른 잎들
땡볕이 좋다고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다
파다하니 뱉는 언어가 금방 고갈되었는지
적막이 낭자하게 나무를 감싸안는다
아직까지 매달려 있는 탱탱한 열매 몇 알
적멸로 씻은 말 몇 마디 풀어내려는지
푸른 혓바닥을 열심히 날름대고 있다
바람의 말, 비의 말, 빛의 말들
호리고 감치는 품이 말끔하다 했는데
눈물에 젖었다 말랐는지 제법 가락이 붙었다
그때,
바로 뒷산에서 휘파람새가 화려하게 울고
우체부 아저씨가 다녀가셨다
전신마취를 한 듯한, 적요로운, 오후 3시.
죽죽竹竹 / 홍해리
하늘바다 헤엄치는 저 은린들아
이쁜 눈썹 푸르게 반짝이거라
눈짓으로나 또는 몸짓으로나
여긴 달 뜬 세상 꿈속이어서
귀에 가득 반짝이는 저 이쁜 것들이
한도 끝도 없이 일으키는 파돗소리
길 다 지우고 산도 모두 허물어 버려
허허벌판 만리 허공 비우고 있구나
네 몸의 그늘과 살의 그림자까지도
대명천지 아니라도 일색이어서
푸른 그리움은 해마다 되살아오고
진달래 붉은 산천 꽃이 피어나
갈 곳 없는 풍찬노숙 나의 가슴을
봄바람소리 흔들어 잠 깨우는구나.
무화과無花果 / 홍해리
애 배는 것 부끄러운 일 아닌데
그녀는 왜 꼭꼭 숨기고 있는지
대체 누가 그녀를 범했을까
애비도 모르는 저 이쁜 것들, 주렁주렁
스스로 익어 벙글어지다니
은밀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
오늘밤 슬그머니 문지방 넘어가 보면
어둠이 어둡지 않고 빛나고 있을까
벙어리처녀 애 뱄다고 애 먹이지 말고
울지 않는 새 울리려고 안달 마라
숨어서 하는 짓거리 더욱 달콤하다고
열매 속에선 꽃들이 난리가 아니다
질펀한 소리 고래고래 질러대며
무진무진 애쓰는 혼 뜬 사내 하나 있다.
황홀한 봄날 / 홍해리
우이도원牛耳桃源 남쪽
100년 묵은 오동나무
까막딱따구리 수놈이
딱딱딱, 따악, 따?, 따?,
빨간 관을 자랑하며
동쪽으로 문을 내고
허공을 찍어 오동나무 하얀 속살을
지상으로 버리면서
집짓기에 부산하고,
암놈은 옆의 나무에서
따르르르, 따르르르, 옮겨 앉으며
딱, 딱, 딱,
먹이를 캐고 있다
새들마다
순금빛 햇살에 눈이 부셔
물오른 목소리로 색색거리고,
연둣빛, 연분홍, 샛노랑 속에
세상을 오르고 내리면서
버림으로써, 비로소, 완성하는
까막딱따구리의
황홀한 봄날.
조팝나무꽃 / 홍해리
숱한 자식들
먹여 살리려
죽어라 일만 하다
가신
어머니,
다 큰 자식들
아직도
못 미더워
이밥 가득 광주리 이고
서 계신 밭머리,
산비둘기 먼 산에서 운다
산벚나무 꽃잎 다 날리고 / 홍해리
―隱寂庵에서
꽃 지며 피는 이파리도 연하고 고와라
때가 되면 자는 바람에도 봄비처럼 내리는
엷은 듯 붉은빛 꽃 이파리 이파리여
잠깐 머물던 자리 버리고 하릴없이,
혹은 홀연히 오리나무 사이사이로
하르르하르르 내리는 산골짜기 암자터
기왕 가야할 길 망설일 것 있으랴만
우리들의 그리움도 사랑도 저리 지고 마는가
온 길이 어디고 갈 길이 어디든 어떠랴
하늘 가득 점점이 날리는 마음결마다
귀먹은 꽃 이파리 말도 못하고 아득히,
하늘하늘 깃털처럼 하염없이 지고 있는데
우리들 사는 게 구름결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가는 길이 물길 따르는 것일지라
흐르다 보면 우리도 문득 물빛으로 바래서
누군가를 위해 잠시 그들의 노래가 될 수 있으랴
재자재자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소리 따라
마음속 구름집도 그냥 삭아내리지마는
새로 피어나는 초록빛 이파리 더욱 고와라.
종(鐘)이 있는 풍경 / 홍해리
1
종은 혼자서 울지 않는다
종은 스스로 울지않고
맞을 수록 맑고 고운 소리를 짓는다
종 (鐘)은 소리가 부리는 종
울림의 몸,
소리의 자궁.
소리는 떨며
가명가명 길을 지우고
금빛으로 퍼지는 울림을 낳는다
2
종은 맞을수록 뜨거운 몸으로 운다
나의 귀는 종
소리가 고요 속에 잠들어 있다
종은 나의 꿈을 깨우는 아름다운 폭탄
그 몸 솟에 눈뜬 폭약이 있다
위로의 말 한 마디를 위하여
종은 마침내 소리의 집에서 쉰다
3
종은 때려야 산다
선다
제 분을 삭여 파르르 파르르 떨며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울음으로
하나의 풍경이 된다
연가 / 홍해리
맷방석 앞
둘이 마주 앉아 숨을 맞추고
맷손 같이 잡고 함께 돌리면
맷돌 가는 소리 곱지 않으랴
세월을 안고 세상 밖으로 원을 그리며
네 걱정 내 근심 모두 모아다
구멍에 살짝살짝 집어넣고 돌리다 보면
손 잡은 자리 반짝반짝 윤이 나고
고운 향기 끝 간 데 없으리니
곰보처럼 얽었으면 또 어떠랴
둘이 만나 이렇게 고운 가루 갈아 내는데
끈이 없으면 매지 못하고
길이 아니면 가지 못할까
가을가을 둘이서 밤 깊는 소리
쌓이는 고운 사랑 세월을 엮어
한 生을 다시 쌓는다 해도
이렇게 마주 앉아 맷돌이나 돌리자
나는 맷중쇠 중심을 잡고
너는 매암쇠 정을 모아다
서름도 아픔까지 곱게 갈아서
껍질은 후후 불어 멀리멀리 날리자
때로는 소금처럼 짠 땀과 눈물도 넣고
소태처럼 쓴 슬픔과 미움도 집어 넣으며
둘이서 다붓 앉아 느럭느럭 돌리다 보면
알갱이만 고이 갈려 쌓이지 않으랴
여기저기 부딪치며 흘러온 강물이나
사정없이 몰아치던 바람소리도
추억의 날개 달고 날아올라
하늘까지 잔잔히 열리지 않으랴.
그녀가 보고 싶다 / 홍해리
크고 동그란 쌍거풀의 눈
살짝 가선이 지는 눈가
초롱초롱 빛나는 까만 눈빛
반듯한 이마와 오똑한 콧날
도톰하니 붉은 입술과 잘 익은 볼
단단하고 새하얀 치아
칠흑의 긴 머릿결과 두 귀
작은 턱과 가는 허리
탄력 있는 원추형 유방
연한 적색의 유두
긴 목선과 날씬한 다리
언뜻 드러나는 이쁜 배꼽
밝은 빛 감도는 튼실한 엉덩이
주렁주렁 보석 장신구 없으면 어때,
홍분 백분 바르지 않은 민낯으로
나풀나풀 가벼운 걸음거리
깊은 속내 보이지 않는
또깡또깡 단단한 뼈대
건강한 오장육부와 맑은 피부
한번 보면 또 한 번 보고 싶은
하박하박하든 차란차란하든
포옥 안기는 한 편의 시 詩.
설중매 / 홍해리
창밖, 소리 없이 눈 쌓일 때
방안, 매화,
소문없이 눈트네
몇 생生을 닦고 닦아
만나는 연緣인지
젖 먹던 힘까지, 뽀얗게
칼날 같은 긴, 겨울밤
묵언默言으로 피우는
한 점 수묵水墨
고승,
사미니,
한 몸이나
서로 보며 보지 못하고
적멸寂滅, 바르르, 떠는
황홀한 보궁寶宮이네
풍란 風蘭 / 홍해리
그대는 백 리 밖에서도
잘 들린다, 그대의 향기
재실재실 웃는 파도에
밀리는 목선같이 오는 향이여
사랑한다는 것은
가슴에 별을 묻는것 아니랴
그리하여
별은 꽃에 와 안기고
백 리 밖까지도
향으로 바다를 넘실거리게 하거니
저 먼 섬 향으로 불 밝힌 등대여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따라
뱃길로 뱃길로 달리다가
바람 타고 하늘 올라
구름 속에 노니는
안개 속 노니는 학이로구나, 그대는
소슬하고 작은 슬픔 같은 꽃이여!
처녀치마 / 홍해리
철쭉꽃 날개 달고 날아오르는 날
은빛 햇살은 오리나무 사이사이
나른, 하게 절로 풀어져 내리고,
은자나 된 듯 치마를 펼쳐놓고
과거처럼 앉아 있는 처녀치마
네 속으로 한없이 걸어 들어가면
몸 안에 천의 강이 흐르고 있을까
그리움으로 꽃대 하나 세워 놓고
구름집의 별들과 교신하고 있는
너의 침묵과 천근 고요를 본다

좌로부터 홍해리, 임 보, 채희문, 박흥순, 이인평 시인
인연 / 홍해리
해질 녘 속리산으로 가는
직행버스 차창으로
아주 잠깐 내뵈인
그의 가느다란 눈웃음
다실 <평화> 등나무 뒤에 숨어서
간질이듯 나의 시장기를 허물고 있네
누굴까
등나무 뒤에 숨어서
뵈일 듯 안 보이는 그는
해질 녘 구름밭에서 혼자 거닐다
서천에서 내렸는지 몰라
엊그제 꿈 속으로 왔다
가슴 쪽대문도 두드리지 않고
돌아가버린 그림자빛의
그 아주 가느란 눈웃음이
가슴도 허물고 있네.
사치시(奢侈詩) / 홍해리
밥이 되나 술이 되나
시를 써 뭘 해
밤낮 없는 음풍영월(吟風?月)
세월은 가고
끼룩 끼이룩 기러기 하늘
돈 나오나 떡 나오나
시는 써 뭘 해
꽃놀음 새타령에
나이는 들고
꺼억 꺼억꺽 벙어리 울음
천년 울면 눈트일까
목타는 길을
푸른 가약(佳約) 하나 없이
홀로 가는 비바람 속
눈물로나 비출까 끼룩 끼이룩.
*************************************************************************************
홍해리(洪海里) 시인
1942년 충북 청원 출생
1964년 고려대학교 영문과 졸업
현재 <우이시> 주간
사단법인 우리시진흥회 이사장
블로그/ http://blog.daum.net/hong1852
카페 / http:// cafe.daum.net/urisi
시집
『투망도』『화사기』『무교동』『우리들의 말』
『바람 센 날의 기억을 위하여』『홍해리 시선』
『대추꽃 초록빛』『청별』『은자의 북』『난초밭 일궈 놓고』
『투명한 슬픔』『애란』『봄, 벼락치다』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시수헌 詩壽軒 / 임보
시수헌은 서울 북한산 골짝 우이동(牛耳洞)에 자리한 한 건물의 다락방
이름이다. 5층 옥탑에 버려둔 두어 평 남짓한 공간을 '우이동시인들'이
얻어 사랑방으로 쓰고 있다. 우이동 시인들이란 고불(古佛) 이생진
(李生珍), 포우(抱牛) 채희문, 난정(蘭丁) 홍해리(洪海里) 그리고 나
이렇게 네 사람이다.
우리들은 20여 년이 넘게들 우이동 골짝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온 숙맥
들로서 이심전심 서로 마음들이 통했던지 87년부터 年 2회씩 <우이동
시인들>이란 사화집을 묶어내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일러 그렇게 부르고 있다. 이틀이 멀다하고 서로를 불러 시주(詩酒)를
즐기다 보니 사랑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던 차에 이 건물
의 주인 沈여사가 우리의 뜻을 알아 선뜻 내어준 방이다.
여럿이 지내기는 좀 협소하고 천장이 낮아 군색하기는 하지만 창을
열면 백운(白雲), 인수(仁壽), 만경(萬景)의 삼각산(三角山)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이니 가히 명당이라 이를 만하다.
애초의 생각으로는 전화기 하나만 놓고 차나 마시며 단조롭게 지내려
했던 것인데 사랑방 소문이 밖으로 새나가 뜻대로 되질 않았다.
구경삼아 찾아온 이웃들이 우리들의 꼴을 보고 민망했든지 살림살이
들을 한두 가지씩 갖다 놓았다. 어떤 분은 그의 고운 손때가 뭍은
정겨운 책상을, 어떤 분은 자신의 집에서 아껴 쓰던 냉장고를, 또
어떤 분은 아름다운 칠기상을, 혹은 차와 다기(茶器)를, 혹은 주과
(酒果)를 이고 지고들 와서 부려놓고 가는 바람에 좁은 방이 더
비좁아졌다. 벽에는 박흥순(朴興淳) 화백이 우리들 네 사람을 기리며
그린 「우이문우도(牛耳文友圖)」와 이무원(李茂原) 사백이 우리를
노래한 족자가 결려 있다. 게다가 북이며 징 꽹과리 등 사물(四物)
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이 얼마나 분에 넘치는 복된 방인가.
차를 마시며 산을 보다가 무료하면 술을 한 잔 하고, 술을 하다
흥이 오르면 북을 잡는다.
詩茶酒鼓 *佛牛蘭華 不聽騷音 不問世情 牛耳好日 勝於仙境
(시에, 차에, 술에, 북에/ 시수헌의 네 사람/
세상 소리에 귀 담고/ 세상 물정에 입 다문/
소귀골의 좋은 하루/ 신선 세상 뺨칠레라!)
부지런히 살아가는 세상 분네들이 우리 사는 꼴을 보면 필시 빈정
댈 것이 뻔하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돌아가는 세상 뛰고 뛰어도
부족하거늘 이 무슨 세상 물정 모르는 한량패 놀음이냐고 말이다.
하기는 그렇다.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름을 얻어
응분의 대접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기도 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남의 눈에 띄게 사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축들도 있다. 그들은 느긋한 게으름을 피우며 남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바보스럽게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긴다. 이 양자의 생활 태도를 놓고 어느 쪽이 더 복된 삶의 방식
인가를 객관적으로 판가름하기란 쉽지 않다.
허기사 우리도 술만 마시고 빈둥대며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인지에 실을 연 40여 편씩의 작품들을 열심히 만들어
내고 있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엔 도봉도서관 강당에서 국악과
더불어 시낭송을 벌인 것이 우금 84회에 이르렀다.
또한 봄에는 시화제(詩花祭)를 가을에는 단풍시제(丹楓詩祭)를
북한산록에서 펼치면서 시와 자연 사랑의 마음을 일깨우기도
한다. 따지고 보면 우리들 하는 일도 제법 없는 바는 아닌 셈이다.
언젠가는 시수헌의 방을 좀 늘리고도 싶다. 그래서 세상의 외로운
시인들이 자주 들러 쉬어 갈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내어 놓았으면
한다. 시수헌의 다락에서 건너다 본 북한산의 신록은 싱그럽기
그지없다. 뻐꾹새 소리도 은은히 골짝을 울리며 들려온다.
이 삭막한 서울에서 그래도 이러한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용의 머리처럼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구쳐
오른 거대한 바위덩이 인수봉(仁壽峯)을 바라다보면서 그처럼
웅장하고 오래 남을 시들의 산실(産室)을 꿈꾸어 본다.
그래서 이 방의 이름을 감히 시수헌(詩壽軒)이라 명명한 것이다.
* 佛牛蘭華 : 古佛, 泡牛, 蘭丁 그리고 필자의 아호인 華山을 뜻함.
'시론 ·평론·시감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해설> 꽃과 별과 시 -洪海里의 '찔레꽃' / 김삼주(시인) (0) | 2010.05.29 |
|---|---|
| [스크랩] 홍해리 선생의 시론과 섬잔대 (0) | 2010.05.14 |
| 洪海里 시집『비밀』출간 (0) | 2010.05.02 |
| 시는 무엇이고 시인은 누구인가 (0) | 2010.04.24 |
| <시> 빨랫줄 (0) | 201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