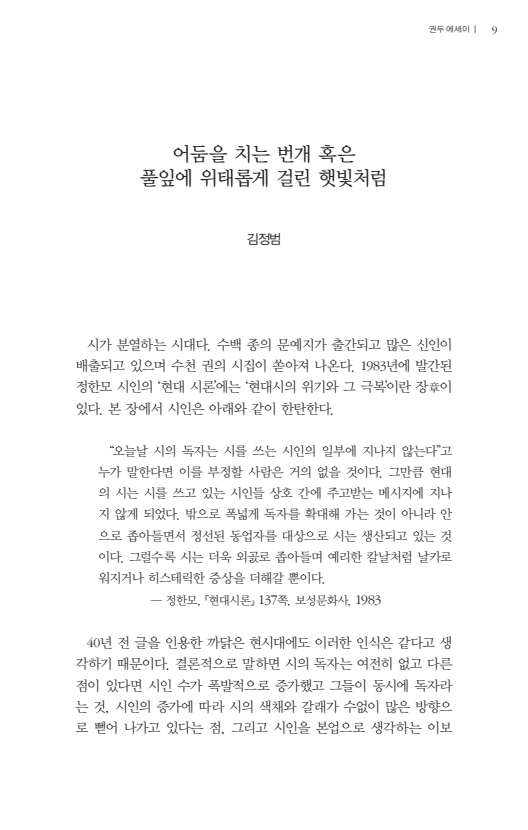[아침의 시 산책] 입력 2023.09.10. 청산은 나를 보고 - 나옹懶翁선사 흉내 내기 洪 海 里 부모님 나를 보고 바르게 살라 하고 자식들 나를 보고 꿋꿋이 살라 하네 출세도 벗어 놓고 권세도 벗어 놓고 산처럼 바다처럼 살다가 가라 하네. 아내는 나를 보고 다정히 살라 하고 친구들 나를 보고 신의로 살라 하네 독선도 벗어 놓고 이기도 벗어 놓고 땅처럼 하늘처럼 살다가 가라 하네. 나옹선사의 ‘청산은 나를 보고’의 시는 언제 보아도 맑은 기운이 넘쳐난다. 이 시를 패러디한 홍해리 시인도 그러하다. 나옹선사(懶翁禪師 1320∼1376)는 고려 말의 뛰어난 고승이다. 이름은 혜근(慧勤), 법호는 나옹, 호는 강월헌(江月軒)인데 선사의 나이 21세 때 문경 공덕산 묘적암(妙寂庵) 요연선사(了然禪師)를 찾아..